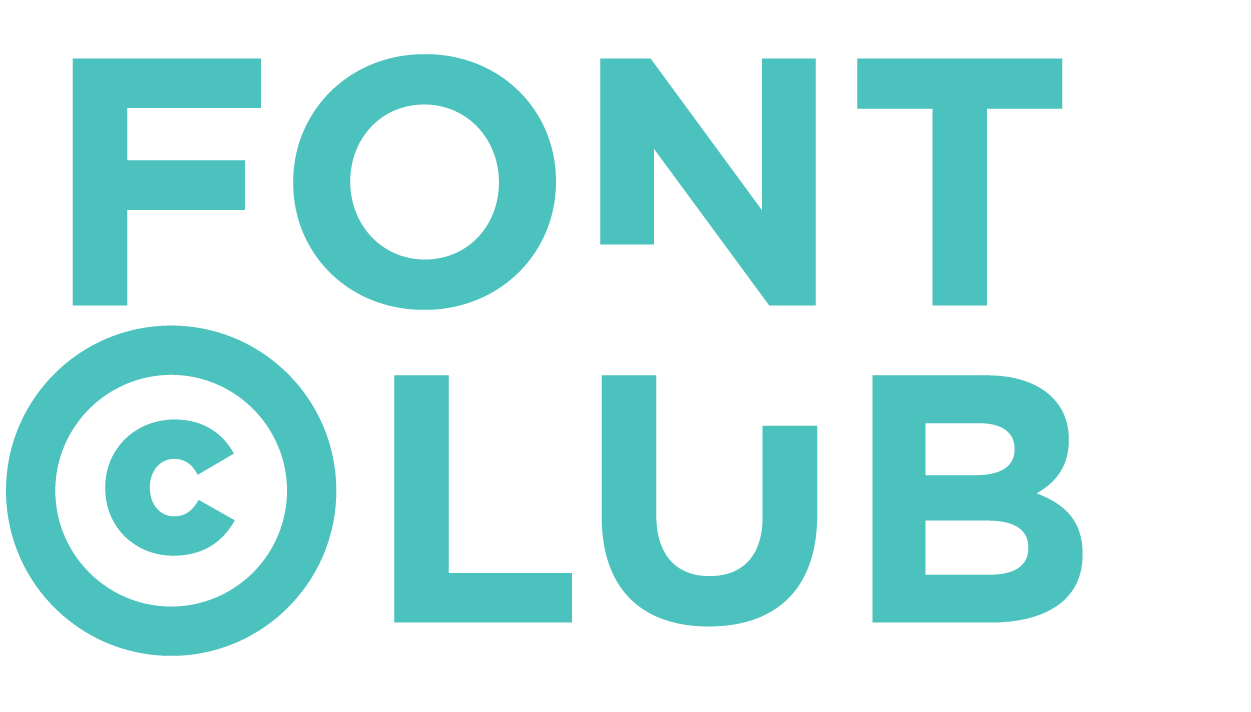김형진의 그럴듯한 이야기2_스타일의 운명

4경에 일어나 머리 빗고 四更起掃頭
5경에 시부모님께 문안드리지요. 五更候公
맹세한답니다, 장차 집에 돌아간 뒤에는 誓將歸家後
먹지도 않고 한 낮까지 잠만 잘 터예요. 不食眠日午
정조는 이 남자의 글이 싫었다. 그래서 그를 군대에 보내고, 문체를 바꾸겠다는 반성문을 받았다. 이렇게 멋진 시를 썼던 성균관 유생 이옥은 그래서 평생을 벼슬 하나 못하고 어슬렁거리며 살았다.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다.
.
정조가 ‘문체반정’을 일으켰다는 얘기, 그래서 패관잡문을 쓰는 학자들에게 반성문을 받고, 순정한 문체를 강제했다는 얘기는 처참하다. (2011년, 지금 듣자니 더더욱 그렇다. 지금이야말로 입이 틀어 막힌 시간이니까.) 박지원에게 <열하일기>의 문체는 속되니 순정한 글을 지어 이에 대해 속죄하라했던 정조의 속내도 못내 궁금하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꽤나 근사하고 매혹적인 얘기다. 한 왕조의 왕이 학생들의, 중인들의 ‘문체’ 따위에 시비를 건다. 당파도 아닌, 품행도 아닌 ‘문체’가 그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간과 공간이란 어떤 것 일까.
.
고등학교때 문학 선생님은 잊을만하면 이렇게 얘기하곤 했다. “문체가 있어야 글은 비로소 문학이 된다.” 또 이렇게도 말하곤 했다. “문체가 없는 글은 이야기일 뿐이다.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면 기민한 입을, 작가가 되고 싶다면 문체를 지녀야 한다.” 아리송한 말이었다.
.
문체가 ‘스타일’로 번역된다는 사실을 난 꽤 늦게 알았다. 스타일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만 했다. 이광수의 스타일과 김동인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걸, 현진건과 염상섭의 스타일도 다르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문체란 주제도 아니며, 소재도 아닌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작품을 작품으로 만드는, 다른 어떤 작품도 아닌 바로 그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문체가 다르다고 설명했을 땐 그토록 모호했던 얘기들이 단박에 모두 이해되는 느낌이었다. 창피하긴 하지만 정말 그랬다.
.
스타일 덕분에 한 작품은 비로소 ‘그’ 작품이 된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멋진 얘기다. 타이포그래피의 세계에도 이 원칙은 고스란히 적용된다. 안상수의 타이포그래피, 정병규의 타이포그래피, 그런 것들 말이다. 민병걸의 타이포그래피, 김두섭의 타이포그래피, 김영철의 타이포그래피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이것들을 등대 삼아 방향과 거리를 가늠하고, 그들의 (시시각각 바뀌는) 좌표를 측량한다. 그리고 이 측량 결과에 따라 우리들의 항해 경로 또한 결정된다. 왼쪽, 오른쪽, 전진, 후퇴.
.
스타일이란, 문체란 결국 남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해주는 장치다. 그것의 좋고 나쁨은 그 다음의 문제다. 예를 들어, 김영나의 타이포그래피, 박우혁의 타이포그래피를 남의 것들 사이에서 분간해내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분명한 스타일은 쉽게 모방의 대상이 된다.) 반면, 정재완의, 정진열, 김형재의 그것은 조금 더 까다롭다. 몇몇 지표(index)들은 존재하지만 일관되지도 않고, 그 현저함의 정도도 약하다. (이런 작업들은 모방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베낀다해도 뭘 보고 베꼈는지 알기도 어렵다.)
스타일은 종종 오해와 착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올해 열릴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제2회 타이포잔치의 포스터가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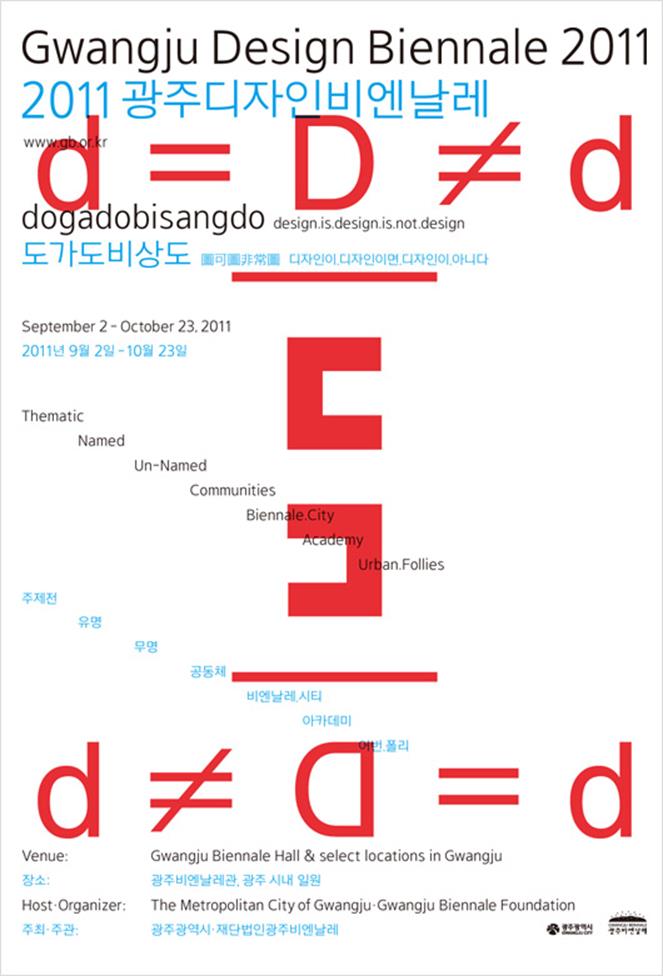

.
생각해보면 타이포그래피에 있어 고유한 스타일이란 다루기 몹시 곤란한 것이다. 활자건, 디지털 폰트건 우리는 대부분 이미 만들어진 형태들 속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고르고, 배치하는 건 우리의 몫일 테지만 우리가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의 크기가 무한히 크지 않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만약 그 운동장이 무한히 넓다면 그거야 말로 재앙이다.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는가.) 유니버스를 골랐다면 우리는 그 서체와 함께 그 특유한 형태감과 비례, 분위기까지 한꺼번에 선택한 셈이다. 푸투라를 골랐대도, 산돌네오고딕을 골랐대도 마찬가지다. 제대로 만들어진 서체라면 그것만으로 화면을 장악하고, 지배하려 들 것이다. 그 자장에서 얼마나 멀리, 혹은 교묘히 숨어 버릴 수 있을까. 설령 그럴 수 있다 해도 그게 과연 현명한 노력일까. 잘 모르겠다.
.
예전에 헬무트 슈미트를 인터뷰했을 때 들은 얘기다. 에밀 루더의 어디가 그렇게 좋았냐는 바보같은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타이포그래피를 하려 노력했다. 에밀 루더는 달랐다. 그는 그저 ‘타이포그래피’를 하려고 했다.”
이건 정말이지 멋진 대답이다. (어쩌면 멋진 오역일지도 모르겠다.) 다들 스타일에 목매달고 죽자고 달려들 때 에밀 루더만은 묵묵히 타이포그래피를 했다는, 이 전설적인 평가에 난 단박에 주눅이 들어버렸다. 그리고 초라해졌다. 이런 제길, 역시 그런거였다. 세상에 어느 대가들이 남들 눈에 띄려고 안달이겠느냔 말이다. 그들은 모두 ‘그저’ 자신만의 작업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나온 작업들은 자신들만의 서랍 속에 처박히지 않고 ‘타이포그래피’의 보편 역사 속에 등재된다.
.
이옥도 이 사실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정조도, 박지원도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유망한 재능을 지닌 성균관 유생의 일생도 행복했을 테고, 정조의 심기도, 박지원의 반성문도 모두 다 평안했을 텐데. 순정고문으로 가득 찬 조선 후기의 풍경보단 패관잡문이 넘나들고, 또 그만큼의 잡놈들이 으스대는 풍경도 꽤 그럴듯 했을 텐데. 그렇게 으스대다 가끔은 나자빠지고, 또 가끔은 폐가망신하는 꼴을 당한다해도 그것 또한 그럴듯 했을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