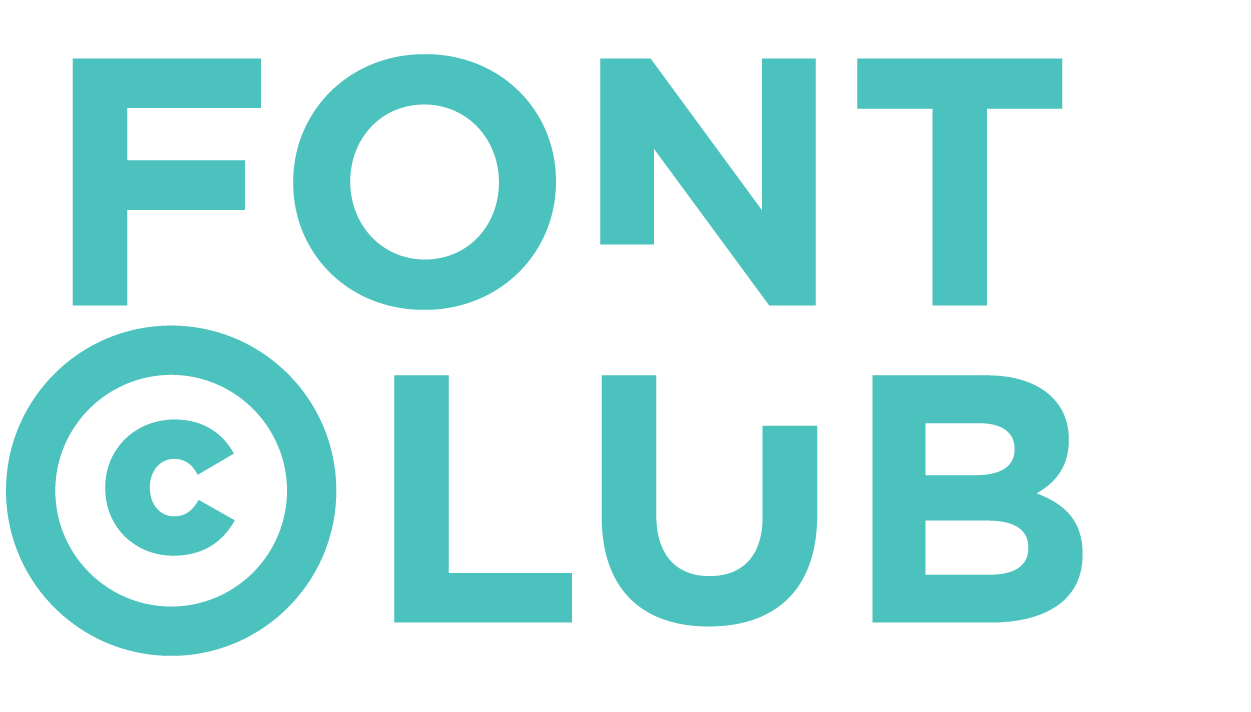김형진의 그럴듯한 이야기.1_진짜와의 거리

글. 김형진(워크룸 공동대표)
ㆍ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내가 어렸을 적엔 ‘다이제스트판’ 책들이 많았다. <로빈슨 크루소>나 <노인과 바다>, <채털리 부인의 사랑> 같은 세계명작은 물론이고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 따위의 유사철학서들, 심지어 (누가 썼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맥아더니, 슈바이처니하는 ‘위인’들의 전기들도 죄다 다이제스트판으로 나와 있었다. ‘다이제스트판’이 뭔지 알 턱이 없던 나는 덕분에 꽤 많은 책들을 요약본으로 읽었다. 그 세계에서는 채털리부인과 산지기와의 사랑도 다이제스트되었고, 상어들과 치룬 노인의 고독한 싸움도 다이제스트되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 그 책들을 읽을 땐 종종 오리온에서 나온 다이제스트 쿠키를 옆에 놓고 먹곤 했다. 그건 내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일종의 격식 같은 거였다. 네모난 다이제스트는 둥근 다이제스트와 함께 해야 제대로 소화되는 느낌이었다. 그래서인지 난 지금도 채털리 부인을 생각하면 왠지 우유 없인 먹을 수 없는 그 뻑뻑했던 쿠키의 질감이 떠오르곤 한다.
ㆍ
지금은 산돌커뮤니케이션의 책임 연구원으로 있는 유지원씨의 기자신분증 카드를 만든 적이 있었다. 2년 전 일이다. 대충 이렇게 생긴 카드였다.
|
|
◀ 유지원씨 카드 앞면 |
왼편엔 정상적인 사진이, 그 오른편엔 픽셀이 보일 정도로 확대한 사진이 프린트되어 있다. 그건 일종의 가벼운 농담이었다. ‘<-> 요만한 거리를 두고 보길 권장함. 너무 가까이 다가오거나 지나치게 자세히 알려 하면 이렇게 뭉개져버릴 것임’.
ㆍ
내가 하는 일이란 결국 다이제스트판 읽기, 혹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만나는 일과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너무 자세히 읽기엔 늘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가까이에서 보기엔 숫기와 열의가 부족하다. 아니, 시간과 열의가 충분하더라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다. 적당한 거리에서 목소리를 보고, 듣고 그걸 평균적으로 요약해내는 일.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타이포그래피의 많은 부분은 이런 모습이다. 적어도 내 경우엔 그렇다.
좋은 편집 디자인 결과물을 두고 사람들은 종종 ‘핵심’을 제대로 표현했다, 라는 식의 말을 한다. 사실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평가다. 말의 핵심을 추상적 조형태와 타이포그래피라는 물질적 매개를 이용해 표현해 낼 수는 없다. 차라리 근사하게 분위기를 냈다고 말하는 편이 훨씬 솔직하다. 얼마 전에 작업을 마친 하이브리드 총서의 표지도 마찬가지다. 이건 그저 그럴 듯한 분위기를 낸 것이지 각 저자의 핵심에 다가갔거나, 그걸 이해하려 노력한 결과가 아니다.

▲ 하이브리드 표지 3종
ㆍ
작가 김사과의 근작 <영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영이는 길게 길게 죽고 싶다고 느낀다. 그러니까,
(11pt, 명조체, 오퍼씨티 25% 정도의 비명) 제발 죽여주세요.”
세상에나. 11포인트 명조체, 25% 어두음을 지닌 비명이란 게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읽고 또 읽고, 쓰고 또 쓰다보니 타이포그래피적으로 울고 타이포그래피적으로 비명을 지르는 작가. 그녀가 진짜 디자이너다.
ㆍ
작년에 비터스윗 나인(bittersweet 9)이라는 이름의 초콜렛집 간판 작업을 하면서 알파벳 한 세트를 만들었다. 좀처럼 하지 않는 짓인데, 시간도 많았고, 초콜렛도 맛이 있어 흥이 난 탓이었다. 안하던 짓, 못하는 짓을 하려니 금방 후회가 들었다. 쓴(bitter) 것과 달콤함(sweet)을 한꺼번에 안고 있는 알파벳이라니. 일주일간 애꿎은 A4와 머리카락만 축내다 결국 아무렇게나 만들고 말았다. 될테로 되라지, 하는 심정으로.

▲ bittersweet
난 창피한 마음뿐이었지만 초콜렛집 주인은 좋아해주었다. 자기가 맞춘 패키지 모서리 느낌과 참 잘 어울린다며. 그녀의 너그러운 마음이 고마웠다.
ㆍ
난 플라톤을 좋아한다. 촌스런 취향이지만 어쩔 수 없다. 그가 말하는 이데아 이야기와 동굴 이야기는 언제나 재밌다. 개라는 이데아가 있고, 실재하는 개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개’라고 부르고, 또 쓴다. 그러니까 내가 관여하는 세계는 이 마지막 단계, 쓰는 세계다. 그곳은 지극히 간접적인, 짐작의 공간이다. 동굴 벽에 비친 그림자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다시 재구성해 내 놓는 것이 나의 일이다.
나는 내가 조판한 ‘개’를 그 개로 이해하고 만족한다. 진짜와의 거리를 가늠하고, 유사함을 측량할 도리가 나에겐 없다. 운이 좋다면 ‘다이제스트판’ 개 정도는 그려낼 수 있으리라. 아주 형편없이 뭉개지진 않은 흐릿한 이미지 정도도 괜찮다. 가끔 늑대로, 혹은 삵쾡이로 오해받아도 억울해하진 않을테다. 코끼리나 원숭이만 아니라면 그래도 그럴듯한 이야기일테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