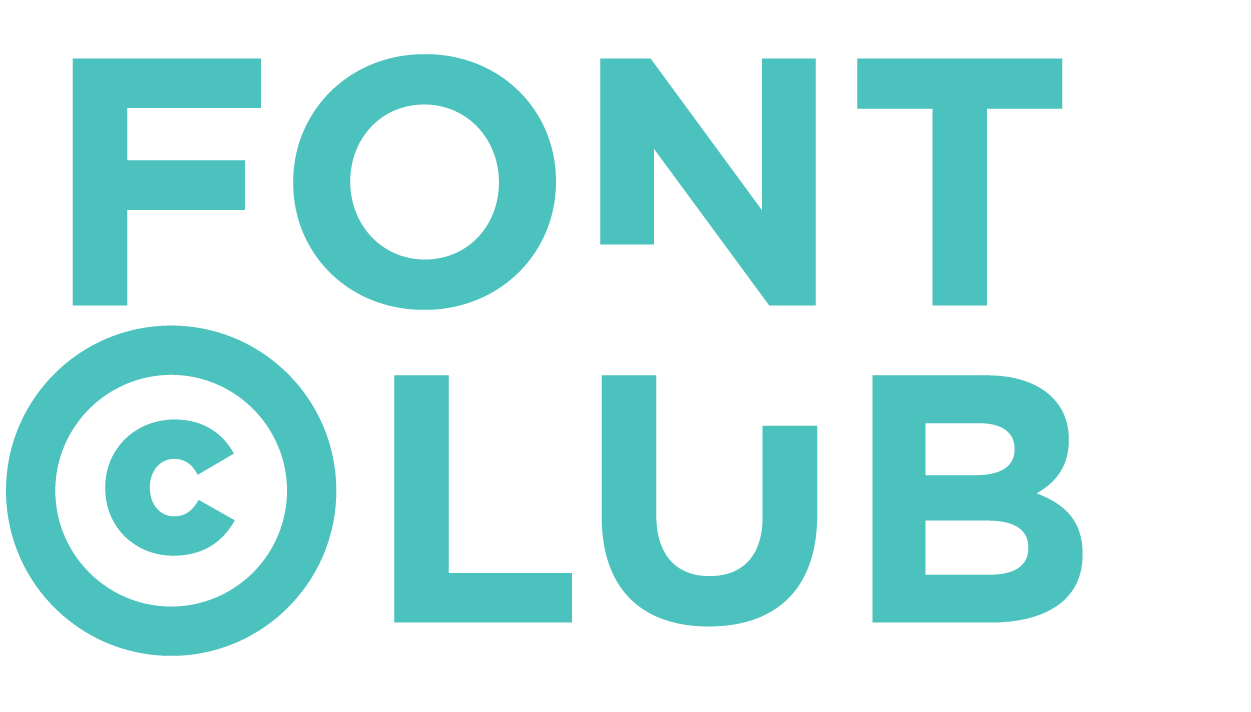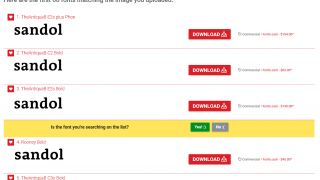밑줄 긋는 디자이너.4_<매거진 B> 외


한 권 속에 수백 개의 브랜드를 담고 있는 잡지와는 달리 단 하나의 브랜드만을 이야기하는 잡지가 나왔다. 매 호마다 전 세계에서 찾아낸 균형 잡힌 브랜드를 하나씩 소개하는 광고 없는 월간지, 매거진 <B>가 바로 그것. LUSH, new balance, snow peak, LAMI, BROMPTON 등 매거진 <B>는 지난 해 11월부터 최근 5월까지 총 여섯 개의 이슈를 발행했다. 땡스북스에서는 이들 모두 빠짐 없이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저는 ‘의식과 스타일의 균형’이라는 맥락에서 창간호에 소개한 프라이탁과 러쉬를 같은 느낌의 브랜드로 보고 있습니다. 외골수 사회 운동가가 아닌, 의식과 더불어 세련되고 감각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조화를 이룬 사회운동가 이미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브랜드. 이러한 브랜드들은 사회 일원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적 의무와 비즈니스를 지속하기 위한 이윤 추구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님을 증명해줍니다.” – 2012년 5월호, ‘LUSH’편 발행인의 글에서

가방, 운동화, 캠핑용품, 만년필, 자전거 등 어느 하나 비슷한 것 없는 이들의 공통점은 <B>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움’, ‘실용성’,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더불어 ‘브랜드의 생각과 의식’이 더해진 꽤 괜찮은 브랜드라는 점이다. <B>는 브랜드의 탄생과 현재, 그리고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다. 브랜드에 대한 좋은 점뿐만 아니라 불편한 점, 개선해야 할 점도 적절히 말하고 있어 브랜드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된다.
new balance를 다룬 이슈에서는 운동화를 뼛속까지 발라내 들여다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FREITAG을 다룬 2011년 11월호에서는 수납에서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는 가방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가방을 엑스레이로 촬영해 싣기도 했다. 해당 브랜드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생생한 제품 이용후기를 들어볼 수 있고 그들이 선호하는 또 다른 브랜드와 제품까지 엿봄으로써 공통된 취향을 발견해내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보는 재미가 있는 만화, 브랜드와 제품이 일상생활에 자연스레 묻어나는 담백한 사진, 그리고 브랜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간결하지만 강렬한 메시지까지. 해당 브랜드 관계자들은 으리으리한 브랜드 광고나 카탈로그보다 구매욕구를 자극하는 이 책에 감사의 절을 올려야 할 것이다. (매거진 <B>는 소개하는 브랜드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는다고 한다)

“어떤 비즈니스를 하든지 환경을 배려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스노우피크가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배려의 기준은 얼마나 자연 소재를 쓰는가 라기보다 ‘영구 보존이 가능한가’를 가장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영구 보존이 가능한 제품이라는 것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소재 역시 그런 생각에 가장 맞는 것으로 사용합니다. 의류는 전부 오가닉 소재를 사용하지만 텐트를 오가닉으로 만든다면 금방 해지겠죠. 눈이나 비에 버티기에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하는 게 적합할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자연 소재를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상황과 목적에 맞게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2년 1~2월 합본 ‘Snowpeak’편, 132쪽, 야마이 도오루 스노우피크 최고경영자 인터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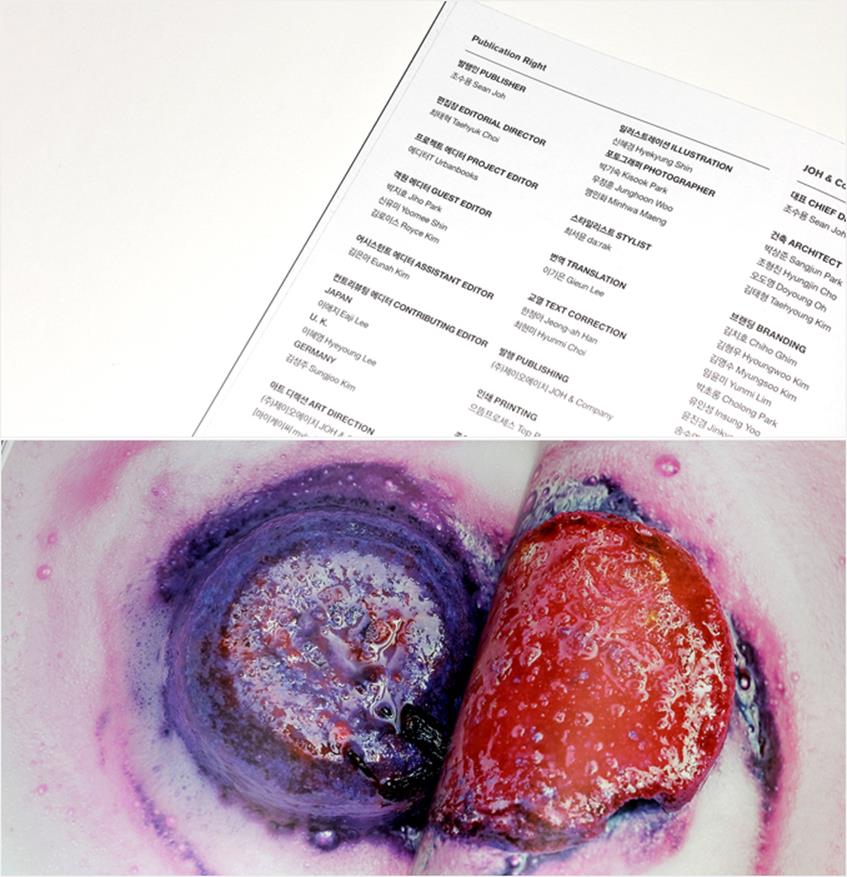
조수용 발행인의 말대로 매거진 <B>는 진정 브랜드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세상을 브랜드적인 관점으로 보며, 새로운 트렌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지하지만, 읽기 쉬운’ 잡지다. 지루하디 지루한 옛 이론서로 경영 수업을 들으며 하품을 해야 했을 때 이 책을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다. 어쨌든 매거진 <B>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나니 “내가 이 브랜드에 대해선 좀 안다!”며 우쭐댈 수 있을 것 같다. 왠지 모를 브랜드 애호도가 생긴 것도 같고, 점점 갖고 싶은 제품이 늘어나 걱정까지 될 지경. 합리적인 가격이라 하지만, 그래도 비싸다. 다음 호에선 또 어떤 브랜드를 소개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글. 땡스북스 최혜영
조수용(발행인)
서울대학교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미술대학원에서 산업디자인 석사를 마친 뒤, 2007년에서 2010년 9월까지 NHN 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제이오에이치(JOH)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빌딩 하나를 짓는 것보다 의자 하나를 디자인하는 일이 더 어렵다.” -미스 반 데어 로에
살면서 기능과 역사를 고민하며 의자를 구입해야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집에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의자가 놓여있고, 회사에 나가면 특별히 주문할 수도 없이 주어진 책상과 의자에 몸을 맞추곤 한다. 자취를 시작하거나, 결혼을 해서 새로 가구를 들일 때가 되어야 구입할 의자에 대해 고민하겠지만 이것도 바쁘거나 다른 일에 신경을 쓰다 보면 대충 구입하게 된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만큼 의자에 앉아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며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비해 참 무신경하다. 나도 내가 앉을 사무실 의자를 가격에 맞춰 적당히 구입하려 했으니 말이다.
“록커라면 록의 계보를 꿰는 것이 당연하듯이 의자 디자이너라면 의자 디자인의 계보를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영화 <스쿨 오브 록>에서 잭 블랙이 미간에 힘을 잔뜩 준 채 칠판 한 가득 전설의 록커 명단을 써내려 갔던 것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지만.” – 6쪽
“의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를 보여 주기 위해 태어났다는 설이 유력해 보인다. 이른바 ‘권좌’는 의자의 첫 번째 속성이고, 의장을 뜻하는 ‘체어맨’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하겠다” – 16쪽
가구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며 의자를 디자인했던 김상규가 세미콜론의 블로그에 연재했던 <의자 탐구 생활>을 묶어 <의자의 재발견>이라는 책으로 펴낸 것은 나처럼 의자에 대해 무신경한 독자를 위한 것이 아닐까? 지금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기능, 형태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리고 의자에 담긴 철학, 역사적인 사건 등이 궁금하다면 이 책 <의자의 재발견>을 같이 읽어 가보자

“아무리 좋은 의자라도 오래 앉아서 좋을 것이 없고 오래 앉아있어도 되는 이상적인 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퀴 달린 의자는 오히려 짐을 옮길 때 카트 대용으로 사용하길 권한다. 철제 접이식 의자는 레슬러들에게 효과만점의 반칙도구로 애용된다. 어떤 의자는 과로에 의해 사망하는 장소이거나 전기충격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최후의 자리이기도 하다” – 21쪽
“결국 새로운 의자를 디자인해서 세상에 내놓기보다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는 세상을 먼저 생각해야 할 상황이다. 그런 다음에야 더 좋은 의자에 대한 요구와 그에 대응하는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다” – 32쪽

“의자를 구입할 당시 한쪽에 매달려 있는 사용 설명서에는 보통 이런(의자를 조절하는) 내용이 적혀있다. 늘 생산자가 설정해 둔 초기값을 바꾸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 72쪽
“테스트, 인증기준은 어디까지나 제조회사에서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공인 자격 조건이다. 이를 획득하려는 노력은 마치 진학이나 취업을 앞둔 사람이 다른 이들보다 더 낫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이른바 ‘스펙’을 쌓은 것과 다를 바 없다” – 110쪽
“스펙’이 그 사람의 업무 능력, 인간성을 대변하기 어렵듯이 의자에 붙은 여러 인증 마크가 제대로 된 의자를 보증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세상에는 자격을 갖춘 것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 111쪽
같은 저자의 책 <어바웃 디자인>을 읽으면서도 느꼈지만 디자인은 공기처럼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다. 숨쉬듯 스며들어 너무나 무신경하게 지나가는 디자인. 하지만 그 존재를 알고 나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곤 한다. 지금 앉아있는 의자도, 아무렇지 않게 조립하던 이케아 의자도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주위에 있는 의자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아는 만큼 보이고 앉는 만큼 느낄 수 있으니까 :-)
글. 땡스북스 김욱 실장
김상규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과와 국민대학교 대학원 공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주)퍼시스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면서 의자를 디자인했다. 전시에도 관심을 갖게 되어 예술의전당 디자인미술관 큐레이터로 일하는 동안 <Droog Design>, <한국의 디자인>, <Laszlo Moholy-Nagy> 등의 전시를 기획했으며, (사)커뮤니티디자인연구소와 (재)디자인문화재단에서 문화 기획과 정책 연구를 했다. 2011년 현재 서울과학기술대 공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어바웃 디자인>, <한국의 디자인02>(공저), <&Fork>(공저) 등이 있으며, 역서로 <사회를 위한 디자인>, <디자인아트> 등이 있다. 디자인한 의자로는 의자 전문 브랜드 파트라(PATRA)에서 출시된 ‘SKIN’과 ‘CITY’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