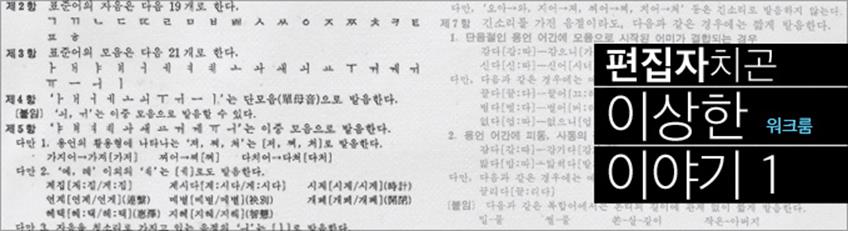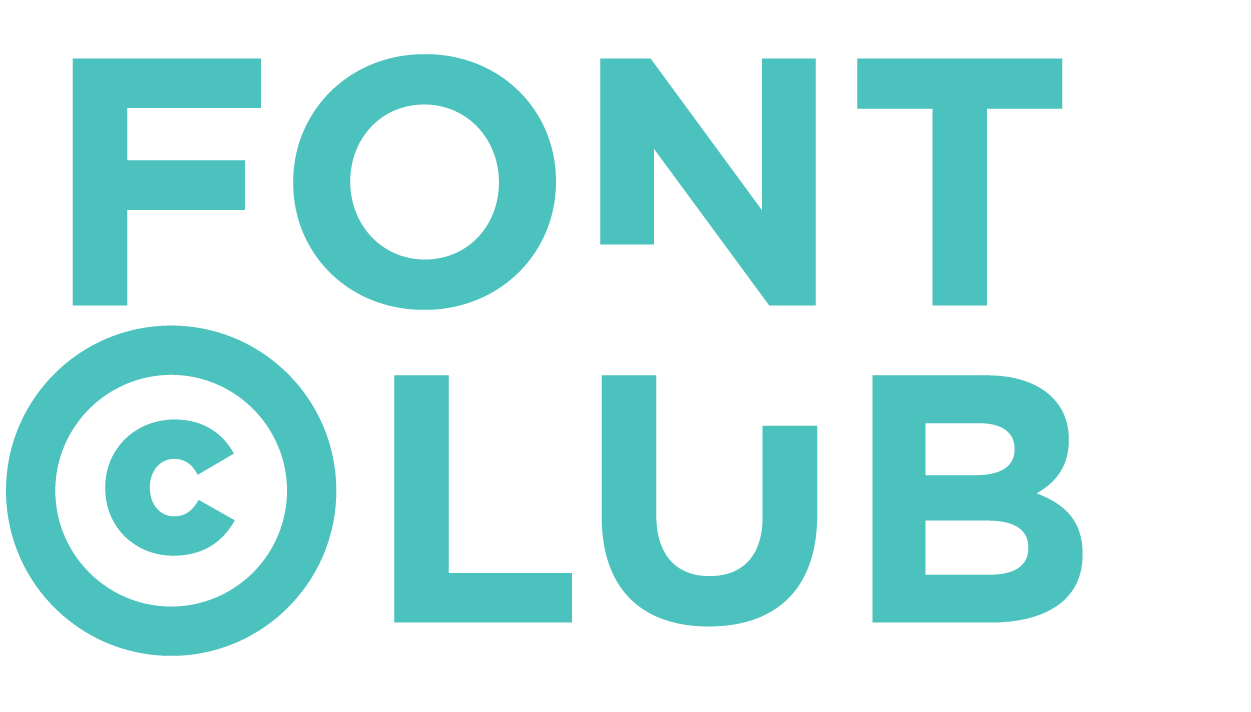편집자치곤 이상한 이야기.1_문장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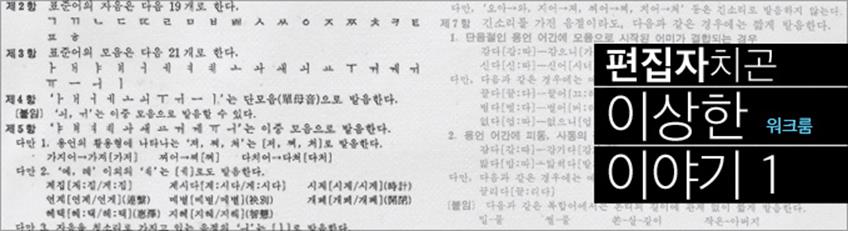
글. 박활성(워크룸프레스 편집장)
2008년이었나, 코엔 형제의 영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본 후에 영화의 원작이 된 소설가 메카시의 작품에 호기심이 일었으나 곧이어 국내에 출간된 또 다른 그의 소설 <로드>를 한동안 읽지 못했다. 쏟아지는 찬사와 줄거리를 보아 하니 내가 읽으면 안 되는 종류의 책이겠거니 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나, 사람을 기다리러 서점에 들렀다 그 책을 충동구매하고 말았는데 결과는 역시나, 매카시의 묵시록은 무시무시해서 어린 아들을 둔, 가끔 우울증을 겪는 부모에게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책이다.
그런데 한편으론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뭐냐 하면, 이 책이 ‘열린책들’에서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거였다. 만약 열린책들에서 나왔다면, 어쩌면 소설의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꽤나 완고하게 적용하는 열린책들의 편집 원칙은 소설 속의 대화를 모두「 」안에 넣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랬다면. 맙소사.
예전부터 궁금하게 여기되, 어디 가서 함부로 발설하기엔 왠지 편집자연하지 않게 생각되는 것이 있다. 바로 문장부호에 대한 이야기다. 여기 <폰트클럽>에서도 문장부호에 대한 이야기가 몇몇 거론된 바 있지만 주로 역사적 관점에서, 혹은 한글꼴 디자인과 관련된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내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의 책 안에서 사용되는 문장부호가 과연 편집자의 영역인지, 디자이너의 영역인지에 대한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책을 만들 때 편집자의 영역과 디자이너의 영역은 겹치지 않는다. 그들은 실존적 차원에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놓인 협곡을 경계로 갈라져 있으며 각각의 영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면, 대개는 하나의 책이 나온다. 말하자면 디자이너는 책의 제목을 정하지 않고 편집자는 표지를 디자인하지 않는다. 편집자는 본문에 쓰이는 서체를 고르지 않고 디자이너는 띄어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
허나 실질적 차원으로 들어가면 둘의 역할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대개 편집자 쪽이 말이 많아진다. 표지 이미지는 물론이고 본문에 쓰이는 서체를 놓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 편집 디자이너라면 늘상 겪는 이야기일 테니 길게 늘어놓지 않겠다. 편집자의 경력이 오래될수록 이런 경향은 더하다. 한편으론 본 게 많아져서 그렇고 또 한편으론 굳어져서 그렇다. 예전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디자이너는 여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방어적 입장이다. 편집자 쪽에서 먼저 펀치를 날리기 때문이다.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고 하면 왜 안 작은지 말해야 하고, 들여쓰기가 과하다고 하면 왜 안 과한지 말해야 하는데 이건 별로 수지맞는 장사가 아니다.
앞서 말한 문장부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편집자가 우선권을 쥐고 디자이너는 편집자가 부여한 자유만 허락 받는다. 우리 출판사의 편집 원칙이 이러하니 잡지는 이렇게 표시하고, 단행본은 이렇게 표시하고, 주는 이렇게 표시하고, 직접인용은 이렇게 간접인용은 이렇게, 괄호는 저렇게, 괄호 속 마침표는 요렇게, 대괄호와 중괄호는 이럴 때, 숫자 표시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디자이너는 솔직히 그런 데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또 출판사(혹은 잡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데 굳이 태클을 걸 건덕지도, 그래서 얻는 이득도 불확실하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으니 출판사마다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다는 건, 그래서 출판사마다 표기 원칙이 다르다는 건 원래는 따라야 할 원칙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다. (이거 이렇게 써놓고 보니 제 무덤을 파는 짓인지 모르겠다)
현행 한글맞춤법은 1장부터 5장까지는 꽤나 논리적이고 정연하게 진행된다. 1장은 총칙, 2장은 자모, 3장은 소리에 관한 것, 4장은 형태에 관한 것, 이런 식이다. 그러다가 갑자기 6장의 제목은 ‘그 밖의 것’이다. 하하. 그리고 이어지는 부록의 제목이 바로 ‘문장부호’이다. 그러니까 문장부호는 맞춤법의 ‘그 밖의 것’에도 들지 못하는 딸린 식구인 셈인데 그나마도 너무 간략해서 출판사로서는 책을 내자면 자체 원칙을 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만 해도 예전에 다니던 출판사의 편집 원칙을 그대로 가져와 조금씩 바꿔서 적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예를 들면 단행본은 『 』, 잡지는 《 》, 숫자 표기는 만 단위로 끊어서 아라비아 숫자를 쓴다든지, 대괄호와 중괄호는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그대로 따른다. 대신 말줄임표는 내 맘대로 세 개짜리를 사용한다든지, 조금 이상한 원칙으로는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다섯 자를 넘지 않는 경우 붙인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다. 마지막 원칙은 내가 다른 어떤 출판사나 잡지사, 편집자에게서도 보지 못한 괴상한 원칙으로,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근본 없는 편집자 취급 받기 딱 좋은 원칙이다.
다시 매카시의 <로드>로 돌아가 보자. 문장부호의 역사가 어떠니 출판사의 편집 원칙이 어떠니 하는 것들을 떠나 만약 그 책의 대사가 큰따옴표나 기타 다른 어떤 식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영하의 <검은 꽃>에서 대사들이 낫표로 표시되어 있다면 텍스트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물론 저자가 원 작품을 그런 식으로 썼으니 출판사는 그대로 따른 것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문장부호는 똑같다. 크건 작건 미미하건 텍스트가 전달하는 의미에 영향을 주는 게 문장부호이고, 그건 저자나 편집자만의 영역이라고 하기엔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
알파벳이든 한글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문자 체계 내에 문장부호가 포함되어 있는 문자는 없다. 그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위한 순수한 그래픽의 영역, 편집 디자이너의 선조 격인 인쇄공의 활자상자 안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현대로 넘어오며 편집 디자이너는 자신들의 언어를 저자와 편집자에게 강탈당한 셈이나 다름없다. 강탈이란 말이 좀 과격하다면 소외 받고 있다고 해도 좋다.
조금 더 논리를 비약해 보자면, 나는 어쩌면 책마다 다른 문장부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는 생각이다. 모든 텍스트에 똑같은 문장부호 원칙을 적용하면 시각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분명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편집자라면(디자이너라면) 한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예를 들어 소설이라는 문맥에 맞는 문장부호의 격이 있고, 사회과학 서적에 맞는 문장부호의 질서가 있다. 한자나 영어 병기가 많은 텍스트에 적절한 문장부호 조판이 있고 괄호나 책 제목이 유난히 많은 텍스트에 맞는 문장부호의 옷이 있다. 또 어쩌면 텍스트의 뉘앙스에 따라 마침표를 거의 안 보이게 처리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걸 편집자의 소관으로 돌리고 원칙이라는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나는 편집자니까 맘대로 할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물론 대개 통용되는 ‘문장부호의 원칙’이 편집자건 디자이너건 일하는 데 편리한 도구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모두를 위한 편리. 그러나 문장부호는 편하자고 있는 건 아니니까.